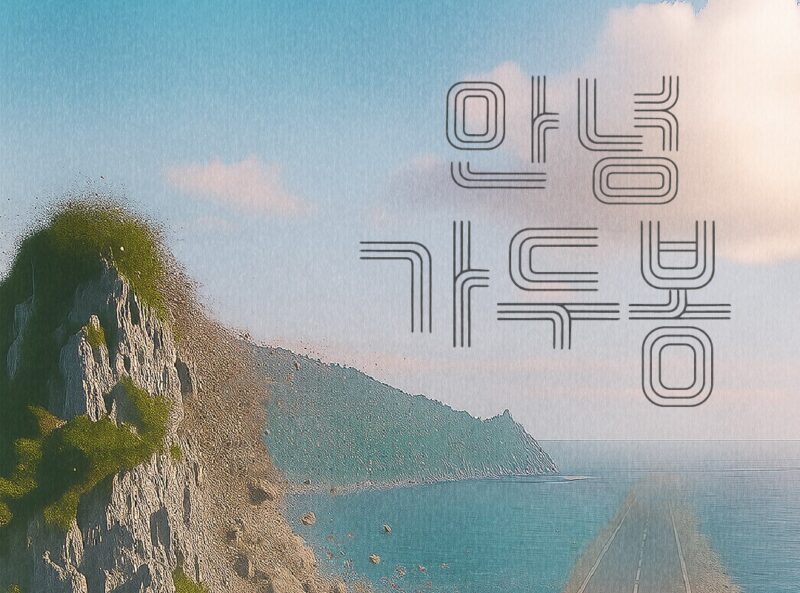[현장스케치]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어린이날 맞이 아쿠아리움 봄소풍 갔어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아동과 세상에없는여행 김정식 대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날’, ‘마음껏 사랑받고 최고로 행복한 날’, 어린이들의 최대 명절이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어디로 놀러 갈지 무슨 선물을 받을지, 어린이들의 마음은 한 달 전부터 두근두근거린다. 유독 기념일이 많은 5월이지만, 어린이들에게 5월은 그저 “어린이날이 있는 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의 이주아동들도 봄소풍을 나섰다. 이 아이들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단체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나선다. 목적지 역시 처음 가는 곳, 바로아쿠아리움이다. 이곳에 특별한 짝꿍 친구들도 함께 했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집에 기부해온 ‘세상에없는여행’ 여행사의 김정식대표와 직원 등 13명이 이주아동의 이모, 삼촌이 된 것이다.
수족관을 처음 보는 아이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이주아동들은 사실 수족관이 뭔지 잘 모른다. 가본 적이 없다. 바다에 가본 아이들도 손에 꼽힌다. 선생님들이 며칠 전부터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큰 물고기 보러간다”고 이해했을 뿐이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다. 그래도 무조건 설레고 좋다. 출발 전부터 흥을 주체할 수 없어 춤을 추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님도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입혔다. 청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청청패션, 샤방샤방한 분홍색 코트에서 애틋한 사랑이 느껴진다.


첫 프로그램은 ‘뽀로로 쿠키’ 만들기 체험. 아이들은 신나게 뽀로로와 동물 모양 쿠키를 만들면서 자원봉사자 짝꿍과도 금세 친해져 조잘조잘 수다를 떨었다. 자원봉사자들도 어느새 짝꿍에 흠뻑 빠졌다. 사진작가가 뽀로로 모형과 함께 아이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자, 자원봉사자들은 저마다“우리 아이도 찍을 거예요”라며 짝꿍을 프레임에 밀어 넣고서는 카메라 뒤에서 “여기 봐!”라고 외쳤다. 영락없이 ‘내 새끼’가 제일 예쁜 부모의 모습이다.


오후 프로그램은 드디어 소풍의 하이라이트, 아쿠아리움이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큰 물고기’를 만난 아이들은 거의 ‘경이’에 가까운 표정이다.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우와아!” 하는 비명이 절로 터졌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동은 “피쉬”라고 외치면서 놀라움을 표현했다. 심지어 옹알이도 못 뗀 생후 7개월 막내 조차 수족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날 오후 2시가 넘어가서야 아이들은 조금 얌전해졌다. 눈빛은 아직 살아있지만 움직임은 확연히 줄었다. 아침부터 내내 쉼 없이 뛰고 춤추고 떠들더니 결국 기력이 소진된 것이다. 마침 낮잠 시간도 다 됐고, 어린이날의 소풍 프로그램도 끝났다. 아이들은 다시 차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큰 물고기와 함께 한 즐거운 추억을 안고 말이다.
물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아이들… 한국아동도 이주아동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물을 좋아한다. 대야에 받아놓은 물조차 반가워서 물장난을 치곤 한다. 아이들은 동물도 좋아한다. 작은 동물은 작고 귀여워서 좋고, 큰 동물은 크고 우람해서 좋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겁이 많은 아이들조차 동물을 만나면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을 드러낸다. 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 수족관에 반하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아쿠아리움은 종일 어린이 손님들로 북적북적했다. 홀린 듯 수족관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한국 아동과 이주아동이 구분되지 않는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 등의 경계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어른들뿐이다.

똑같은 아동이지만 이주아동들에게는 이토록 신나는 아쿠아리움이 그저 남의 이야기였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이주민 부모들은 이렇게 멀리 나들이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 또 아이와 달리 체류 형태가 불법인 부모들은 혹여 낯선 곳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추방될까 하는 염려에 아이와 야외활동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날 행사를 총괄한 문미숙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마음이 참 벅차네요. 앞으로 이런 나들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까? 흔히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주아동은 한국 아동과 똑같이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조금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에, 한 마을을 넘어서는 더 큰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오늘처럼 자원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주아동 역시 소풍도 다니고 체험학습도 하면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주아동의 보육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면, 이주아동 역시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어린이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회가 바뀌는 데에도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우리 이주아동들은 더 많은 이모와 삼촌이 필요하다’
글 박효원ㅣ사진 임다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