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 김기수 교수
생명의 권리, 그 아름다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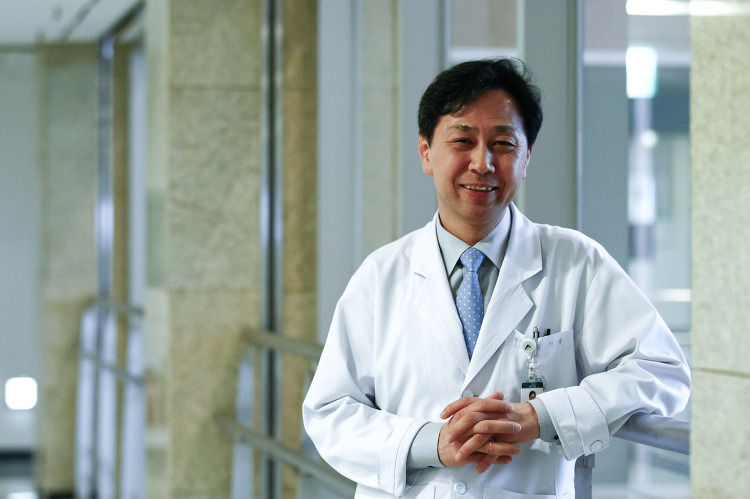 ⓒ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간단합니다. 76년에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도 89년에 아산병원 소아과로 온 것도 모두 삶의 원칙에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 위에서 많은 신생아와 만났고요. 나름의 원칙과 그에 따른 열정이 제게 ‘지금’을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생아 분야는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생아를 진료했던 피수영 선생님을 모시려 했는데 무산되고 고생 좀 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미국에서 들여온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갖추긴 했는데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했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작은 아이들이 매일 들어와선 일주일 만에 다 죽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90년대만 해도 아기를 낳은 후 “이 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보호자의 물음에 “살 가능성이 60%”라고 대답하면 퇴원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2달 내지 2달 반을 입원하면 총 진료비가 3,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 2~3,000만 원을 웃돌았으니 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아기가 장애를 가질 확률도 높았고요. 매일 그런 편견과 싸워서 신생아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오죽하면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른둥이를 낳았다고 하면 아기 할머니가 통장을 아기 아빠에게 건네주면서 “내 전 재산인데 이걸로 아기를 살려라”는 장면이 있었겠는가. 때문에 김 교수는 매번 퇴원하겠다는 부모들과 싸웠다. 살 가능성이 60% 이상이나 되는데 왜 집에 가냐고 물으면 그들을 되레 “선생님이 아기가 살 가능성이 100%이고 죽을 가능성이 0%라고 하면 치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답을 요구했다. 밖으로는 펀딩을 끌어오느라, 안에서는 보호자를 설득하느라 진이 빠지는 건 당연지사. 그때마다 김 교수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시절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되뇄다. 자신이 의학을 공부하고 신생아를 선택한 바로 그 ‘생명’의 권리, 아름다운 원칙을 자꾸 매만졌다.
그러던 차에 95년, 피수영 선생이 아산병원에 정착했고 그것이 신생아중환자실의 분기점이 됐다. 김기수 교수는 피 선생은 물론이요 김애란 선생과 팀을 이뤄 그간 꿈꿨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쳤다. 더불어 이른둥이의 당연한 삶, 신생아의 권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도 노력했다.
“사실 국가에서 해주는 건 일반적인 80%를 위한 거예요. 나머지 더 아픈 20%를 위해 다른 지원 사업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뇌성마비라든지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퇴원했다가 재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 국가 지원 규정 가지고는 보호자들이 힘들어요. 100~200만 원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가 참 반갑고 고마워요.”

김 교수가 1년에 만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환자는 650명여. 그 중 350명이 이른둥이이고, 120명 정도는 1500g 미만이다. 그 중에 130명이 선천성심장질환 수술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식도가 없다든지, 장이 막혔다든지 하는 외과(장)계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몇몇은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여러 기형을 가지고 있고, 또 몇몇은 분만할 때 입은 뇌손상으로 온 아기들이다.
이렇게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싶은 신생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집중력이 요구된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이른둥이 부모 타이틀을 획득하듯 신생아중환자실의 의사들 또한 무시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원칙에 근거한 흔들림 없는 선택! 앞서 말했던 ‘생명에 대한 존중’을 늘 품고 다녀야 하는 이유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 교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와 공존, 상생하기를 소망한다.

“그냥 어느 순간이든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보호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의 모든 분들도 그리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둥이를 지원 사업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바란다면 핫라인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언제라도 손 뻗어 닿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각지대 없는 지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글. 우승연사진.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