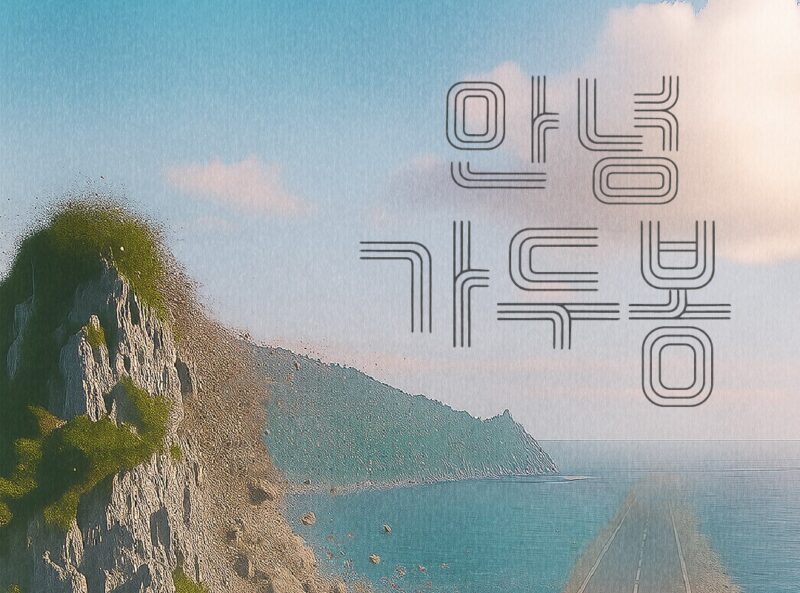이 땅에서 건강할 권리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

가난과 교육, 노동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존재하는 게 보건의료시스템이라고 『건강할 권리』의 저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강조한다. 소수자 역시 건강권을 누려야 한다고, 누구도 삶과 죽음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건강권을 앞세울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이다. 국적을 잃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시민은 그 최소한의 안전망에서 걸러진다. ‘미등록이주민’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걸러져 열외되는 존재다. 바로 그들을 위해 발족한 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건강할 권리에 초점을 맞춘 의료공제회이다.
개인의 두려움을 넘어선 의료공제회

희망의 친구들은 현재 회원 9,000명과 지역 NGO와 40개 상담소 그리고 700개의 의료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 25만 명 중 80%가 미등록 상태, 즉 불법체류였어요.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의료 부분이었죠. 보험도 없고 발각될까봐 병원에 가지 않아서 작은 병을 키워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때 이주민 활동 단체들이 의료대책으로 민간차원의 제도를 만든 게 의료공제회예요.”
김미선 상임이사는 처음을 더듬었다. 1999년 9월에 치른 창립식은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문제 핵심을 어떻게 사회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겸했다. 이전에 제각각 활동해 오던 12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단체의 개별적 고민을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100여개의 의료기관도 참여했다. 그렇게 무료 진료소가 아닌 그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모은 공제비로 아픈 사람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비로소 씨를 뿌려 태동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희망의 친구들은 현재 회원 9,000명과 지역 NGO와 40개 상담소 그리고 700개의 의료기관이 이 의미 있는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매월 6,000원으로 안전망을 짜다

‘희망의 친구들’은 어디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이 돼주었다.
‘희망의 친구들’은 어디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이 돼주었다. 매월 1회비 6,000원만 내면 자신은 물론 돈 없이 큰 병을 앓는 이주민노동자를 지킬 수 있으니, 건강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지원은 없었다. 중요한 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참여였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넘어서야 했다. 사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미등록이라도 근로확인서를 가져오면 응급질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왔다. 안타까운 건 미등록이주민들이 아직도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문을 두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시도조차 않는다. 그것은 미등록이주민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간다. 김 상임이사를 비롯한 희망의 친구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 치료 받으면 노출되고 추방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병원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해왔죠. 그리고 결국 얻어냈어요. 치료 받을 땐 고지의 의무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이 보장돼 있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출산이다. 1년 동안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4백 건 중 출산은 1/3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미등록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그 순간부터 미등록 아기가 되어 엄청난 병원비를 스스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신생아중증질환의 이른둥이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큐베이터 비용만으로도 아찔하다. 고액의 치료비는 의료공제회에서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땐 모금포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거나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와 같은 외부 지원과 연계한다. 필리핀의 제임스는 그렇게 지원을 받은 아기이다. 희망의 친구들 사람들이 잊지 못할 소중한 생명이다.

희망의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
“여성이주노동자인 마리테스 씨는 임신 중에 아기가 다운증후군과 심장기형, 장폐색 등 장애를 가질 거라고 진단받지만 출산하기로 결심해요. 엄청난 병원비에 덜컥 겁이 나긴 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죠. 그렇게 낳은 제임스가 심장수술을 받고 마리테스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이 아빠는 출산을 반대해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 아픈 제임스를 치료하는 그녀에게 치료비 지원은 그저 돈이 아니었어요. 지쳐서 꺾일 듯한 몸을 지탱해주는 응원과 지지였어요.”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과 연계된 병원 현장에선 외국인 이른둥이 출산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이른둥이의 부모가 미등록이주민인 경우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2014년까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통해 지원받은 1,908명의 이른둥이 중 175명이 외국인 가정(미등록 포함)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등록 아이에겐 기본적인 필수예방접종,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때입니다. 임시체류허가증 형태라도요.”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공생

희망의친구들 가족들
미등록이주민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법 구축돼 있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면 그들은 열외자로 뚝 떨어진다. 올 상반기에 휘몰아쳤던 메르스 때도 그랬다. 정부에서는 연일 뉴스가 나오고 병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부랴부랴 각국 언어로 메르스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건 희망의 친구들이었다. 언어도 안 되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취약한 계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발 디딘 사회 또한 안전해 진다. 열외 시킨 누군가를 위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김 상임이사는 강조한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조건이 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다문화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왜 그런 사람들까지!”를 외치시며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도가 없으면 다른 데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부작용 비용에 비하면 생명을 살리는 비용이 훨씬 긍정적입니다. 누구라도 삶과 죽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지길 바랍니다.”
글 우승연 | 사진 임다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