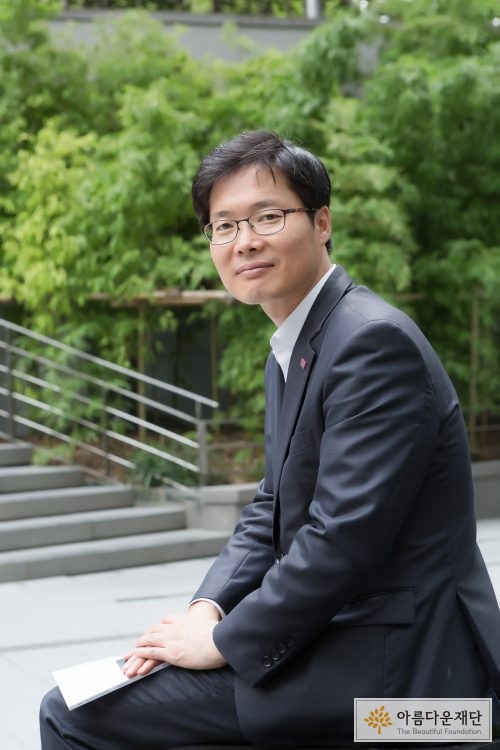
차마 가지 못한 시인의 길 위에서
구멍 숭숭한 마른 모래 위로 떨어진 물방울 하나와 오롯이 마주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의 단어를 고르기 위해 몇 날 밤을 지새우는 시인의 작업이다. 리듬과 하모니 무엇보다 울림을 갖기 위한 이 유기적인 몸짓은 그 행위 자체로 목적이다. 순간과 진실의 접점 포착.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토해진 창작물은 읽는 사람을 흔들고 그들의 잠자는 기억과 소망을 불러 깨운다. 납작하고 시든 삶을 위로한다. 그러한 시인의 힘이 흥국생명 영업부에서 22년을 일한 오완섭 작가가 시를 쓰는 이유다.
“2013년도 3월에 첫 번째 시집 『빛과 어둠을 표류하다』를 냈습니다. 3년 만에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고요. 1995년부터 21년 5개월째 흥국생명에서 일하던 지극한 영업인이 시를 쓰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죠. 돌아보면 경북 안동 끝자락 산골에서 태어나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내면에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서가 시로 드러나곤 합니다. 이 마음을 사람들과 교감하는 시공을 초월한 플랫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국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다. 한데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는 “나는 땅 파먹고 살았는데 너는 글 파먹고 살 것이냐”며 반대하셨다. 농업경제학과는 어떨까도 싶었지만 ‘농’자만 들어가도 화를 내셨다. 그래서 경제학과로 진로를 정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회사생활은 시를 쓰는 일과 철저히 분리됐다. 계수판을 보고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적 언어를 떠올릴 순 없었다. 대신 회사를 벗어나면 감성의 코드가 바뀌었다.

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까지
“하는 일이 숫자 보는 건데 그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내에게 계수관리가 힘들다고 하니 회사 다니기 싫은가보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흘리듯 ‘애들은 점점 크는데…’ 말해서 제가 그랬죠, 열심히 다닐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대부분이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1집에선 40대를 기점으로 오버랩 형식의 시를 썼고, 2집은 ’詩 중년을 말하다’ 부제가 말하듯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의 가슴앓이를 표현했어요.”
과중한 업무, 익숙지 못한 인간관계와 틀에 박힌 일상 때문에 이곳 아닌 저곳을 꿈꾸기 일쑤였던 20대, ‘더 이상’ 어리지 않으나 ‘아직’ 늙지 않은 시절, 제법 안정됐고 현실을 아는 나이인 만큼 하나둘 책임져야 할 것도 늘어나던 30대와 확실히 달랐다. 마흔을 넘어서니 세상을 두루 경험하면 농익은 선택이 가능하구나, 비로소 알게 됐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不惑) 수식은 아마도 그 풍부한 경륜의 합리성 때문이구나 주억거리기도 했다. 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터닝 포인트도 필요했다. 인생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자신감과 긍정심, 정의감을 재정비하는 시간. 아름다운재단의 인세 기부는 바로 그 ‘더 의미 있는 존재’의 발판이자 입구였다.
“시집 관련한 기부를 하고 싶어서 회사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공명심을 내세운다면 그룹홈을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한데 그건 지원이 잘 되기도 하고, 그냥 일시적인 후원과 다른 의미의 기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소재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 사람과 자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용기, 사랑과 고독 등을 시로 표현했듯이 그 결실 또한 어떤 소통의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세 기부는 그런 제 소망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독자들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구나’ 느끼고 우리 가까이 있는 기부를 다시 한 번 떠올리고 공감하기 바란다. 이런 과정으로 얻은 동참의 계기가 ‘인세 전액 기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나눔에 서서히 동화되다
인세 기부금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오완섭 작가는 학창시절 오른쪽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네 아빠도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장애를 결핍의 현상이 아닌 다양한 양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적 기반으로 차별을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의 아이들뿐 아니라, 그가 지원한 장애아동들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 누군가에게 삶을 나누어 줄 미래를 거머쥐기를 희망한다. 그때는 ‘나에게 기부해 주었던 혹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지’ 미소 지으며 떠올린다면 기쁠 거라고 덧붙인다.
“어느 한 기업이 거금을 쾌척해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동화되어 좋은 쪽으로 침습이 확대되는 과정이 결국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이나 선후배들도 이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시집을 낸 나의 용기가 만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나눔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불씨 혹은 마중물과 같다. 보이지 않는 곳을 밝히는 첫 순간이요. 물을 뿜어 올리기 어려운 마른 펌프를 추동하는 자원이 바로 나눔인 것이다. 여러 기관마다 하는 정기기부는 물론, 종이박스나 파지, 쇠 등을 모아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께 드리는 것도 그 맥락에서 실천하는 일상의 나눔이다.
오완섭 작가는 인터뷰를 마치며 시 독자이자 잠정적 기부자에게 인왕산의 밤 그림자를 소개했다. 달빛과 가로등이 길바닥에 그려낸 사물의 그림자를 꼭 한 번 경험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것이야 말로 먼 풍경과 앞 혹은 위만 바라보느라 놓쳐버린 실상일지도 모른다고, 화려하지 않은 낮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띔한다. 그들과 마주하면 분명 삶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시인의 이야기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래서 오완섭 작가의 시가 궁금하다. 그의 인세 기부가 불러올 작은 변화를 기대해 본다.
글 우승연ㅣ사진 이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