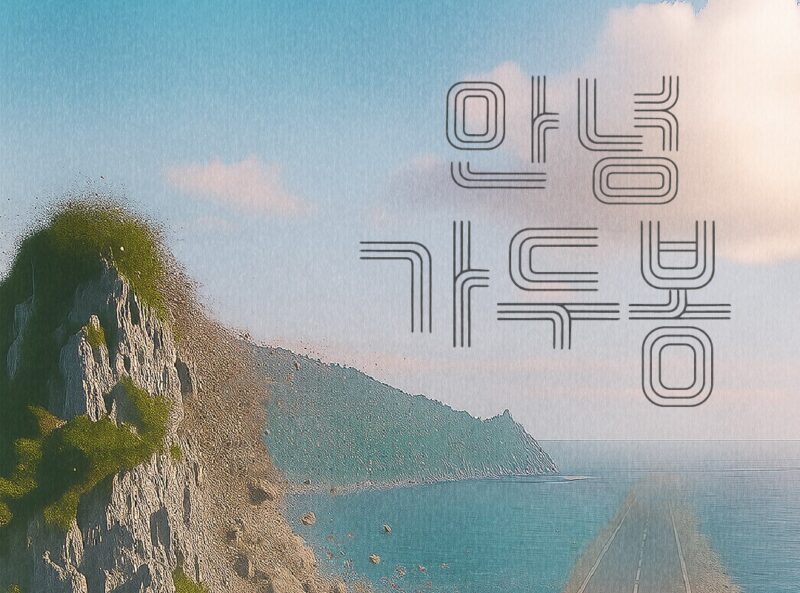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7년의 변화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을까요? 지난 7월 22일~23일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에서는 청소년 구술작가 프로젝트 1박2일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캠프가 끝난 후 지난 3월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고 있는 구술전문가 그룹 소리 활동가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
대추리 10년의 기억, 평화로 다시 쓰다
– 평택평화센터 ‘청소년, 대추리를 기억하다’ 현장 –
1980년 광주가 이랬을까. 마을 골목마다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미란다 원칙 고지 같은 것은 없었다.
여기저기서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렸다. 공포.
─ 박래군,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그 마을이 점령되던 날’ 中
2004년, 정부는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결정한다. 여의도 면적의 5배(349만 평), 세계 최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 285만 평이 대추리·도두리 일대였다. 대추리 주민들은 이전에도 쫓겨온 역사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을 세운다며 한 번, 한국전쟁 때는 미군기지를 만든다며 한 번 더, 그렇게 두 번을 쫓겨온 뒤 일군 땅이 대추리였다. 갯벌까지 밀려나도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황새울 들판과 도두리 들판을 일궈 농사를 지었다. 정부는 그런 땅을 두고 빨리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후 주민들은 935일의 밤을 촛불로 밝혔다.
투쟁의 한가운데서도 농사일을 손에서 놓는 이 하나 없었다. 경찰과 용역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논마다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 주민들은 맨몸으로 굴착기에 맞섰다. “평생 논밭만 부쳐 먹고 살던 사람”이라 “반미도, 민주주의도 모르던” 노인이 “논밭을 마구잡이로 밀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때려서 연행하는 게 민주주의였냐?”며 소리쳤다. 그 후로 십 년 동안 그 외침은 용산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다시 반복됐다. 결국 대추리 주민들이 삶터를 빼앗기고 노와리로 이주한 지 십 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추리평화마을 황새울기념관
대추리의 십 년을 주민 목소리로 기록한다는 소식을 듣고 ‘평택평화센터’를 찾았다. 센터가 있는 ‘대추리 평화마을’에는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백여 명의 주민이 이주해 살고 있다. 행정명은 ‘노와리’지만 주민들에게 이 마을은 ‘대추리’다. 마을 입구엔 ‘대추리’라 적힌 비석이 눈에 띈다. 들어서자마자 지은 지 얼마 안 된 전원주택이 줄지었다. 임윤경 사무국장(평택평화센터)은 동네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났어도 이렇게 좋은 집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여기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잔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절기에는 콩을 심어야 하고, 옥수수를 심어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잖아요. 일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의 슬픔이 보이지 않나 봐요.”
그녀는 10년 전, 만삭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대추리 투쟁에 참여했다. 대추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다. 평택에 살다 보면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었다. “평택은 미군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평택의 8%가 미군기지죠. 소음 등의 피해를 10명 중의 4명이 받아요. 미군 기지니, 평화니, 뭐니 관심 없이 살겠다는 사람도 여기 살면 외면하기 쉽지 않아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택에 사니까 활동을 하게 됐죠.”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는 대추리의 지난 10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조금 특별한 ‘구술사’를 선택했다. 기록자 또한 전문가가 아닌 대추리의 10대 청소년이다. 센터를 찾은 날, 청소년들은 이미 오전에 인터뷰를 마치고 물놀이 중이었다. 1박 2일의 긴 여정이었다. 어제는 구술자인 동네 어르신들과 첫만남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질문을 만들어 오늘 아침 인터뷰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 뒤에는 묵묵히 뒤에서 자리를 지키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이하 소리)의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난 4월부터 평택을 오가며 청소년에겐 다소 낯선 구술사의 의미와 실전 노하우를 공유했다.
홍세미 씨(소리 활동가)는 “여덟 번 정도 만나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짚어봤다고 말했다. “십대 청소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인터뷰는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 연예인 인터뷰만 봐왔으니까요” 이 작업은 ‘소리’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소리’의 구성원 중에는 십 년 전 대추리 투쟁 때 함께 했던 활동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홍은전 씨(소리 활동가)는 “대추리 투쟁 이후 십 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한다. “투쟁 과정에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투쟁이 일단락 된 이후 삶의 이야기는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뷰 전 기록자인 청소년과 구술자인 주민들이 만나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출처 : 평택평화센터 페이스북)
홍은전 씨(소리 활동가)는 오전 인터뷰를 되짚으며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고 있을 때 연행됐던 기억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아이 곁에 있던 한 어른은 “너희 엄마 그때 대단했다”며 기억을 보탰다. 참여한 스무 명의 청소년 중 몇몇은 이렇게 대추리 투쟁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명숙(소리 활동가)은 “집이 훨씬 넓어졌지만, 아직도 집이 낯설다”는 어르신의 말이 마음에 박힌다고 말했다. “한 분은 대추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막막함”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제일 젊은 분이 막막함이라고 할 때는 살던 땅을 떠나온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옛 대추리 마을을 향해 운전한다는 이야기, 힘이 없던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경의 ‘거시기’를 잡으며 싸웠단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생생한 대추리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쏟아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이 대추리의 역사를 직접 듣고, 글로 표현하는 일”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대추리의 어른들은 이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활동가 (홍은전, 명숙, 홍세미)
주민들이 구술한 이야기는 첫눈 내릴 연말 즈음 책으로 엮일 예정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모아 ‘미군기지 저지 투쟁’의 역사도 정리 중이다. 결과물이 모이면 ‘아카이브전’이 열린다. 평택평화센터와 소리의 활동가들은 청소년이 써낸 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낼 생각이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소리의 활동가들은 구술사는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대추리 청소년의 몸을 통과해 나올 글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괜스레 올겨울이 기다려진다.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활동가
글 우민정 | 사진 김권일
 |
평택평화센터는 2007년 설립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함께 해온 분들의 뜻을 이어 평택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미군문제를 다루는 평화운동단체입니다. http://www.peacep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