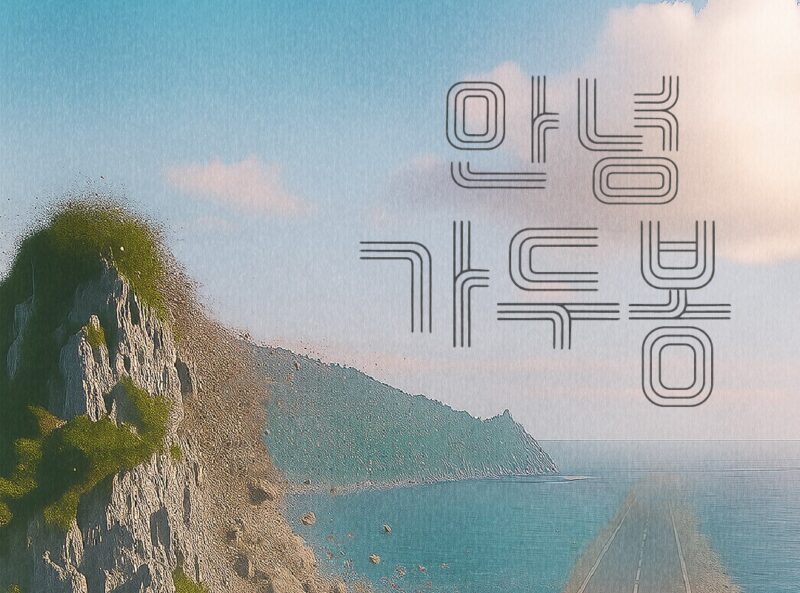“낳을 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퇴원, 그 이후입니다. ”
분당 차병원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 이임정팀장
출산 후, 엄마는 없었다.
힘겹게 버텨 아기를 낳았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한 가지. ‘아기는 무사한가.’ 아기에게 전전긍긍한 출산이니 자연스레 산모는 뒷전이다. 산모 본인도 마찬가지. 아기의 안정을 찾는데 급급할 뿐, 본인 스스로의 안정은 찾지 못한다. 이임정 팀장은 산모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할 만큼은 다 했잖아요. 엄마들은 정말 최선을 다 하세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주라도 출산을 늦추려고, 엄마들은 무던히 애를 쓴다고. 어렵게 버티고 버텨,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는다는 것. 아프지 않아도 될 것을 아파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도 엄마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엄마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이른둥이 부모를 만나, 사회복지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팀장은 말한다. 사실, 출산 직후에는 아기의 생존과 건강 상태에 온 정신을 쏟다보니 자책할 여유도 많지 않다고. 게다가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주변에 있는 환자 가족들과의 교류도 하니 일정 부분 케어가 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퇴원 후라고 했다.
퇴원 후, 대부분 이른둥이 엄마들은, 좀처럼 남의 손에 아기를 맡기지 못한다. 힘들게 태어난 만큼 소중한 아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아기만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 그러다 아기에게 후유증이라도 나타나면 엄마들의 ‘나 때문에…’가 재발한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기가 다시 입원하는 건 아닌지’라며 자책한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엄마 뿐 아니라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려야한다. 이미 아기의 후유증은 재발했고, 장기전은 시작됐다. 병원 한 두 번 다닌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닌 터. 엄마들도 마음을 다잡아야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 저희 또 왔어요~”
이 팀장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주 있는 경우죠.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 만나고 온 분 아가도 후유증으로 재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둥이의 생존률이 높아진 만큼, 이제 화두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른둥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 꾸준한 재활치료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그런데 재입원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재입원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고. 칼을 대는 ‘수술’이라면 지원을 받을 경로가 많지만 이른둥이들의 재활치료 등의 보존치료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참 고마워요. 사실 재입원을 시작하고 장기전을 치르는 이른둥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보통 이른둥이 엄마들의 경우, 맞벌이를 하다가도 직장을 포기하기 마련. 아빠의 수입만으로 가계가 꾸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게 수입은 줄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니, 경제적인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투병생활에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힘에 부친 이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데 정작 도움의 손길은 많지 않다는 것.
물론 지원금은 제한돼 있고, 지원해야 할 사람들은 많다. 이 팀장은 강조해서 말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번 큰 일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료받고 회복하길 반복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만나기가 무섭게 이 팀장이 건넨 말도 그것이었다. 재입원비 지원이 제도화되고, 정책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현재 후유증이 남은 이른둥이 부모들에겐 앞으로의 치료와 재활이 더 큰 과제일터. 출산 당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른둥이 부모들의 장기전을 함께하는 손길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